|
얼마 전, 후배 신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잠시 숨을 고른 적이 있었다. 이런저런 강의와 모임 등에서 그리스도교가 지니는 매력적인 혹은 도드라지는 특성으로 꽤나 긴 시간을 들여 이야기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는 한마디였다. “성당에선 수구(守舊)니, 빨갱이니 하는 서로 갈라놓는 말들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제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제 뜻과 다른 이를 멀리하는 경향을 지닌다. 삶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기준으로 이편, 저편을 갈라놓는 데 우리는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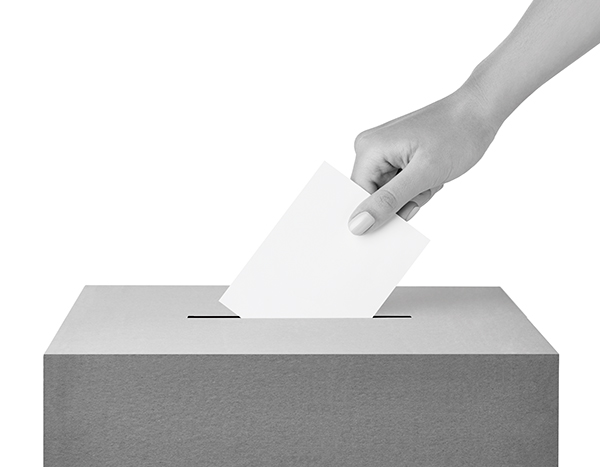
4월,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총선이다. 교회가 정치에 훈수를 두는 건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예언자적 직분을 망각할 수 없는 게 교회이기도 해서 총선 즈음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고민해 볼만하다. 그리고 교회의 자리에 대한 고민은 1세기 무렵 유다 사회의 정파적 갈등 안에 홀로 외로운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자리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다.
1세기 유다 사회는 세금 문제로 시끄러웠고 아팠고 처참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 여겼던 유다 백성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에 분개했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과 로마의 문화융합정책에 찬동하는 유다 귀족들을 경멸했다. 소소한 저항 운동에서 군사적이고 폭력적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1세기 유다 사회는 로마에 맞서고 또 맞섰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 사라지는 장면은 유다 사회의 저항에 대한 로마의 단호하고 잔혹한 응답이었다. 하느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화염에 휩싸이는 건, 하느님 백성 유다인의 애간장이 시커멓게 녹아내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로마와 유다의 극단적 대립에서 어느 쪽이셨을까. 예수님의 ‘정치적’ 입장을 에둘러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른바 ‘세금논쟁 이야기’(마태 22,15-22; 마르 12,13-17; 루카 20,20-26)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유명한 문구는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이해하는 데 자주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당시 유다 사회는 정교분리의 세상이 아니었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것이라 여긴 유다 백성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 사회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였을터.
예수님은 민족적, 정파적, 진영적 논리에 휩싸이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가자면 마지막엔 늘 ‘사람’이 남는다. 안식일 법을 어겨서라도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모세의 율법과 관습에 어긋나더라도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신 게 예수님의 일이었다. 심지어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나그네 된 이들, 나아가 감옥에 갇힌 이를 우리가 흠숭지례로 모시는 하느님에 빗대어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다.(마태 25장)
편을 가르면 편하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계급을 외치면 괜한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안정과 이익이 다른 민족과 나라, 그리고 동네들에 배타적이어서는 안된다. 총선에 임하는 우리 교회는 누가 옳다 그르다고 하는 선동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잊히고 묻히는 소리들을 민감하게 들어주고 알려주어 ‘사람’이 잊히지 않게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복습해야 하지 않을까.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꾸만 세상을 가르치려 드는 샌님들이 사회 정의와 정치에 대해 갑론을 박할 때, 진정한 교회는 잊힌 채 아파하는 작은 이들의 자리에서 아픔을 공부하고 나누는 일에 매진할 뿐. 거기엔 보수니 진보니, 수구니 빨갱이니 하는 말들은 매우 낯설고 헛헛한 무엇이 된다. 거기엔 사람을 형제로,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사랑만이 단단하고 뚜렷하게 살아 있을 뿐이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거창한 이념들로 갈라서거나 줄세우는 유치한 소꿉장난은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려 보냈으면 한다.
하여, 4월의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 동네 일꾼으로 나서는 이들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을 얼마나 애틋이 살피는지 꼼꼼이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총선의 시간을 끝으로 사라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4년 동안 묵묵히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 내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본디 신앙의 일이 그러하므로, 본디 정치의 일이 그런 것이므로. 그래서 성경은 믿고 따르는 일의 끝을 서로 다른 민족이 모여 온 하느님의 잔치(이사 25,6-10)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시사철 따뜻하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천상 예루살렘’으로 소개한다.(묵시 21-22장) 성당(聖堂)에서는 ‘성당(聖黨, 거룩한 모임)’의 당헌, 당규를 따름이 마땅하지 않겠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