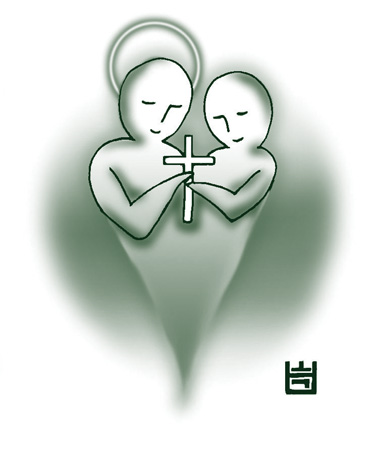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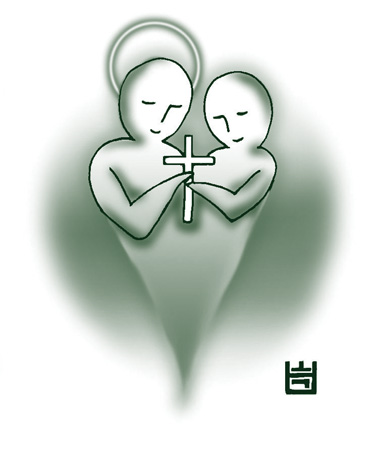
한국교회의 시작은 1784년에 이승훈(베드로)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200년 후 한국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행사가 있었는데,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봉헌된 한국천주교 200주년 신앙대회 및 시성미사가 그것이다. 103분의 순교 선조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 그 미사는 한국 신자들 모두의 가슴에 강한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성가 가사의 한 대목처럼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랑’만 할 것인가?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는가? 성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인가?
하느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느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다. 원래 거룩함을 뜻하는 단어 하기오스(hagios, 그리스어)는 ‘구별하다’ ‘갈라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종교 안에서는 특별히 하느님의 것으로 구별 짓는 것을 뜻한다.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축성(祝聖)이라고 부르고, 타종교에서는 ‘성별(聖別)’ 혹은 ‘축별(祝別)’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축성과 축복은 구별되어야 한다. 축복은 사제가 사람이나 건물, 성물, 성수, 초, 등에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엿새 만에 창조사업을 마치신 다음 이레째 되는 날을 주님의 날로 삼으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선언하셨다.(창세 2,2-3 참조) 하느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성전이나 성찬의 전례를 거행하는 제대는 하느님께 봉헌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식탁(성찬의 식탁)이 된다. 성전봉헌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주교님께서 성전 기둥과 제대에 크리스마 성유로 표시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다. 크리스마 성유를 바름으로써 그 장소는 하느님의 집이 되고 그 제대는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봉헌대가 되는 것이다.
크리스마 성유의 도유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구약시대부터 예언자나 왕, 사제들은 기름부음을 받았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세례·견진·성품성사 때에 주례자는 대상자에게 기름을 바른다. 세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리스마 성유의 도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다. 세례성사와 함께 우리는 인호(印號)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례 중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고 점찍는 거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따로 뽑으셨다는 이야기다. 견진 때는 더욱 굳건하게 하는 도유이고, 성품성사 때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확인하는 도유이다.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느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다. 일곱째 날이 거룩하고,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이 거룩하고, 하느님의 몫으로 뽑힌 사람들 역시 거룩하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우리는 적어도 세례 순간만큼은 성인(聖人)이다. 하느님의 소유로 불림을 받았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상태니 이보다 더 성스러울 수는 없다. 개신교 신자들이 서로를 성도(聖徒)라고 부르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내가 하느님께 속해 있는 한 나도 성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한다. 성인(聖人)으로 살 것인가, 속인(俗人)으로 살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