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동 중화리에 위치한 대구 교회의 첫 본당터 그리고 신자촌 ‘신나무골’은 신자들이 나무 아래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1977년 7월 11일 제1차 성역화사업을 통해 영남교회 선교 요람지 기념비가 세워졌다.
또한 “죽어도 성교를 믿겠소.”라며 순교한 이선이 엘리사벳 묘소가 1984년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주선으로 이곳에 이장되었고 대구 교회의 첫 본당터를 복원하는 한편 김보록(아길로) 신부의 흉상을 건립하며 지금의 신나무골 성지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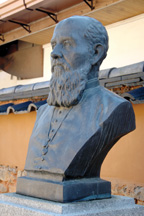 신나무골에 처음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15년 을해박해로 추정하고 있다. 청송 노래산, 진보 머루산, 일월산중의 우련밭과 곧은정에 살던 신자들이 잡혀 대구 경상감영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들어왔다. 이때 잡혀 온 김대건 신부의 작은 할아버지 김종한(안드레아)은 1816년 12월 19일 순교했다. 남편 김종한의 옥바라지를 위해 따라 온 아내와 아들은 지금의 연화리 피정의 집 일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김해 김씨가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나무골에 처음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15년 을해박해로 추정하고 있다. 청송 노래산, 진보 머루산, 일월산중의 우련밭과 곧은정에 살던 신자들이 잡혀 대구 경상감영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들어왔다. 이때 잡혀 온 김대건 신부의 작은 할아버지 김종한(안드레아)은 1816년 12월 19일 순교했다. 남편 김종한의 옥바라지를 위해 따라 온 아내와 아들은 지금의 연화리 피정의 집 일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김해 김씨가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831년 조선교구가 창설된 후 1836년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사제들이 파견되었다.
다블뤼 주교는 신나무골에 대하여 “그 지방은 매우 작고 매우 의심을 받는 지역으로서 20-30명 밖에 성사를 집행할 수 없는 공소이다. 그러나 이 지방은 큰 읍내(대구)의 작은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한 지방이다. 이 큰 읍은 여러 시기에 걸려 순교자들이 많이 난 곳으로 유명하다.”는 기록을 남겼다.
최양업 신부가 1849년부터 1861년 6월까지 경상도 지방을 순회하던 시기인 1860년 2월 신나무골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신자들은 사방으로 도망갔고 이중 칠곡 읍내에서 신나무골로 피신 온 배손이는 한티 사기굴로 도망갔다 잡혀 배교했지만 아내 이선이 엘리사벳(사망 당시 42세)과 장남 배도령 스테파노(사망 당시 16세)는 신앙을 증거한 후 작두날에 목이 잘려 순교했다.

과로로 사망한 최양업 신부를 대신하여 다블뤼 주교가 1865년 초까지 이 지방을 순회 전교했고, 1866년 병인박해 직전까지 리텔 신부가 경상도 지역을 맡았다.
병인박해로 신나무골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박해가 끝나자 다시 모여 신자촌을 형성했다. 상주에서 피난을 와서 백운동에 살고 있던 이시우(요한, 이대길 신부의 선대) 가정이 매주 주일을 지냈다.
  1882년 경기도 지평면 고시울과 강원도 원주 부흥골 등에 머물며 경상도 지방 순회 전교를 시작한 김보록 신부가 이곳에 머물면서 대구와 인근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행했다. 1885년 후반 김보록 신부가 신나무골 이이전(안드레아) 집에 정착했고, 이를 대구 본당의 시발점으로 본다. 김보록 신부는 블랑주교에게 보낸 사목보고에서 “경상도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순회 선교사가 그들을 방문하고 다시 떠나가기 때문에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1886년 4월 경상도 첫 사제관을 신나무골에 두었다.”고 적고 있다. 김보록 신부는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화서당’을 설립하였고, 이 학당은 1920년 신동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신·구학문과 교리를 가르치던 배움과 복음전파의 전당이 되었다. 1882년 경기도 지평면 고시울과 강원도 원주 부흥골 등에 머물며 경상도 지방 순회 전교를 시작한 김보록 신부가 이곳에 머물면서 대구와 인근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행했다. 1885년 후반 김보록 신부가 신나무골 이이전(안드레아) 집에 정착했고, 이를 대구 본당의 시발점으로 본다. 김보록 신부는 블랑주교에게 보낸 사목보고에서 “경상도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순회 선교사가 그들을 방문하고 다시 떠나가기 때문에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1886년 4월 경상도 첫 사제관을 신나무골에 두었다.”고 적고 있다. 김보록 신부는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화서당’을 설립하였고, 이 학당은 1920년 신동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신·구학문과 교리를 가르치던 배움과 복음전파의 전당이 되었다.
1888년 김보록 신부 후임으로 보두네 신부에 이어 죠조 신부가 사목했지만 1890년 부산으로 떠나면서 신부가 상주하지 않게 된 신나무골은 동학란을 피해 피신 온 빠이아스(하경조) 신부가 1894년 가을 왜관 가실(낙산)성당을 설립했다. 이후 가실성당 소속 공소가 된 신나무골은 왜관성당을 거쳐 현재의 신동성당에 귀속됐다.
신앙 선조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신나무골 성지에는 이선이 엘리사벳 묘역, 대구 교회 첫 본당터와 김보록 신부 사제관, 김보록 신부 흉상, 명상의 집이 있고 사제관에는 과거 사진과 각종 유물, 성물이 전시되어 관람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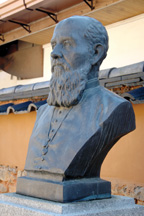 신나무골에 처음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15년 을해박해로 추정하고 있다. 청송 노래산, 진보 머루산, 일월산중의 우련밭과 곧은정에 살던 신자들이 잡혀 대구 경상감영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들어왔다. 이때 잡혀 온 김대건 신부의 작은 할아버지 김종한(안드레아)은 1816년 12월 19일 순교했다. 남편 김종한의 옥바라지를 위해 따라 온 아내와 아들은 지금의 연화리 피정의 집 일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김해 김씨가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나무골에 처음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15년 을해박해로 추정하고 있다. 청송 노래산, 진보 머루산, 일월산중의 우련밭과 곧은정에 살던 신자들이 잡혀 대구 경상감영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들어왔다. 이때 잡혀 온 김대건 신부의 작은 할아버지 김종한(안드레아)은 1816년 12월 19일 순교했다. 남편 김종한의 옥바라지를 위해 따라 온 아내와 아들은 지금의 연화리 피정의 집 일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김해 김씨가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882년 경기도 지평면 고시울과 강원도 원주 부흥골 등에 머물며 경상도 지방 순회 전교를 시작한 김보록 신부가 이곳에 머물면서 대구와 인근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행했다. 1885년 후반 김보록 신부가 신나무골 이이전(안드레아) 집에 정착했고, 이를 대구 본당의 시발점으로 본다. 김보록 신부는 블랑주교에게 보낸 사목보고에서 “경상도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순회 선교사가 그들을 방문하고 다시 떠나가기 때문에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1886년 4월 경상도 첫 사제관을 신나무골에 두었다.”고 적고 있다. 김보록 신부는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화서당’을 설립하였고, 이 학당은 1920년 신동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신·구학문과 교리를 가르치던 배움과 복음전파의 전당이 되었다.
1882년 경기도 지평면 고시울과 강원도 원주 부흥골 등에 머물며 경상도 지방 순회 전교를 시작한 김보록 신부가 이곳에 머물면서 대구와 인근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행했다. 1885년 후반 김보록 신부가 신나무골 이이전(안드레아) 집에 정착했고, 이를 대구 본당의 시발점으로 본다. 김보록 신부는 블랑주교에게 보낸 사목보고에서 “경상도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순회 선교사가 그들을 방문하고 다시 떠나가기 때문에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1886년 4월 경상도 첫 사제관을 신나무골에 두었다.”고 적고 있다. 김보록 신부는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화서당’을 설립하였고, 이 학당은 1920년 신동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신·구학문과 교리를 가르치던 배움과 복음전파의 전당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