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가 혹은 예술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보통의 경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연주를 한다. 무대에서 만나는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 때문에 조금 특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는 여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문제로 웃고 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공허한 가슴에 들이닥치는 기쁨과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소리를 내는 즐거움을 손끝에 느끼고 싶을 때 음악가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연주를 한다.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악기를 어루만지며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같은 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할 수도 있겠지만, 손이 가는 대로 자신만의 즉흥적인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마치, 간혹 우리가 글로 적힌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 솔직하게 내 마음속의 말들을 꾸밈없이 내뱉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즉흥연주는 완전한 창작인가? 그렇지 않다. 즉흥연주는 화음과 형식을 구사하는 ‘재창조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무렇게 몇 개의 음들을 소리 내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추고,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음을 쓰고, 어떤 형식을 빌어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말을 배우기 위해서 낱말을 익히고,맞춤법을 배우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지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화성과 형식이라는 음악의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악언어를 통해서 청중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즉흥연주는 작곡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작곡가는 마치 문학가처럼 오선지 위에서 음악을 지어내는 일을 한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까닭에 연필과 지우개를 손에 쥔 채로 고치고 다듬는 일에 익숙하다. 즉흥연주가도 음악을 지어내지만 작곡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앞에는 악보가 놓여있지 않고, 그의 손에는 연필이나 지우개가 들려있지 않다. 웅변가가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을 통해 군중을 선동하듯, 즉흥 연주가는 그 순간에만 울려나올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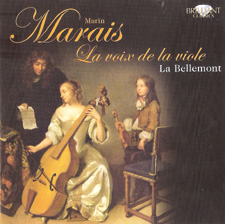 선율과 화음을 따라간다. 작곡가가 하나의 음을 놓고 몇 날 며칠 심사숙고 하는 반면, 즉흥 연주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음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문맥 안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또 다른 음악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데 익숙하다. 이 ‘의도되지 않은 찰나의 선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것이다. 선율과 화음을 따라간다. 작곡가가 하나의 음을 놓고 몇 날 며칠 심사숙고 하는 반면, 즉흥 연주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음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문맥 안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또 다른 음악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데 익숙하다. 이 ‘의도되지 않은 찰나의 선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것이다.
17세기 중후반 프랑스, 절대왕정의 꽃이었던 루이14세의 음악가들 중에 마랭 마레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날의 첼로와 비슷하게 생긴 비올라 다 감바라는 악기의 명인이었는데 어찌나 기막히게 연주를 했던지 그가 연주할 때에는 “천사가 내려와 음악을 뿌려놓는 것 같다.”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어느 날 그는 홀로 악기 앞에 앉아 그의 스승을 생각하며 즉흥연주로 음악을 쏟아냈고, 이는 <생트 콜롱브를 추모하며>라는 제목의 수사본으로 남아 전해진다. 흐뭇하고 행복한 추억, 아쉽고 비장한 후회와 슬픔의 상념들이 선율 속에 이어지면서 삼백년도 훨씬 전에 한 음악가가 바라본 그 스승의 모습이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다.
“비올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마랭 마레라는 젊은 제자에게, 스승인 생트 콜롱브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제자는 스승 곁에서 좀 더 높은 경지의 음악을 배우기를 원했다. 몇 개의 작은 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가면 여름철 블랙베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생트 콜롱브가 비올을 자주 연주 했었는데 제자인 마랭 마레는 헛간 뒤에서 이를 숨죽여 지켜보곤 했었다.”(Evrard Titon, 17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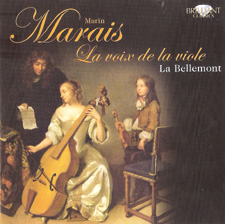 선율과 화음을 따라간다. 작곡가가 하나의 음을 놓고 몇 날 며칠 심사숙고 하는 반면, 즉흥 연주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음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문맥 안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또 다른 음악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데 익숙하다. 이 ‘의도되지 않은 찰나의 선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것이다.
선율과 화음을 따라간다. 작곡가가 하나의 음을 놓고 몇 날 며칠 심사숙고 하는 반면, 즉흥 연주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음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문맥 안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또 다른 음악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데 익숙하다. 이 ‘의도되지 않은 찰나의 선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