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시간은 이렇게 물이 흐르듯 새로운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1월은 모든 이에게 항상 ‘시작’이란 단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학교는 반대입니다. 지난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1월입니다. 1년간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하며 알게 된 여러 면을 꼼꼼하게 나이스에 기록하고, 진학 결과를 잘 마무리 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사는 저 같은 경우엔 늘 새로운 학년,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는 3월 초가 ‘시작’입니다. 대신 1월, 2월은 늘 제겐 ‘아쉬움’과 ‘이별’이란 단어가 제 곁을 지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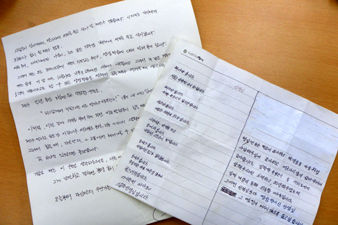 지난 2013년은 제게 참 축복 같은 해였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맡아 본 고1 아이들은 제게 신선함과 설렘을 선물했습니다. 중학생 티를 제대로 벗지 못한 순수함이 저를 참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연일 많은 대중매체들이 ‘학교폭력’이란 단어를 쏟아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교실 청소 당번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1부 야간 자율학습 후 쉬는 시간 20분간 청소를 위해 교실을 향해오는 우리 반 아들들이 있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자발적으로 친구들의 몸수색까지 감행하며 학급 전체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주는 멋진 아들, 피곤해 보인다며 집에서 쉬라는 다정한 말을 건네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아들들이 있었던 2013년은 제겐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 감사”를 외치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13년은 제게 참 축복 같은 해였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맡아 본 고1 아이들은 제게 신선함과 설렘을 선물했습니다. 중학생 티를 제대로 벗지 못한 순수함이 저를 참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연일 많은 대중매체들이 ‘학교폭력’이란 단어를 쏟아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교실 청소 당번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1부 야간 자율학습 후 쉬는 시간 20분간 청소를 위해 교실을 향해오는 우리 반 아들들이 있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자발적으로 친구들의 몸수색까지 감행하며 학급 전체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주는 멋진 아들, 피곤해 보인다며 집에서 쉬라는 다정한 말을 건네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아들들이 있었던 2013년은 제겐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 감사”를 외치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2학기 후반부가 되면 학급 조 ·종례 시간에 ‘2분 스피치’를 합니다. 소재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쭈뼛쭈뼛 망설이며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순번이 되면 자신의 특성을 살려 친구들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싫지만 자전거 타기는 정말 좋아하고 자신있다는 한 아이는 친구들에게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그럽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나, 학교 폭력, 두발 자유화 등 시사적인 문제를 화두로 내걸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 자신이 꿈꾸는 장래의 삶을 향해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는지도 이야기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제 열일곱의 시간들이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 시간대 속에서 많이 아파했던 제 고통과 깔깔대며 행복했던 제 기쁨들이 한무더기로 제 앞에 쏟아집니다. 잠시 제 추억을 되짚어가는 행복한 작업이 제 안에서 시작됩니다.
 12월의 그날도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교단에 섰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그 아이는 무척이나 쑥스러워하며 교탁에 몸을 구부린 채 한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시 한편을 낭송한 후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 두발자율화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자신의 주장으로 제게 열변을 토한 친구가 있었기에 툭 던지는 그 친구의 말에 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녀석은 의외라는 듯 “오! 도전장!” 이란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교단에 섰지만 마음 수양이 덜되었는지, ‘이놈들이 어리지만,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나.’ 싶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섭섭해졌습니다. 선생도 역시 사람인가 봅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의 반응을 뒤로한 채 천천히 시 한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그날도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교단에 섰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그 아이는 무척이나 쑥스러워하며 교탁에 몸을 구부린 채 한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시 한편을 낭송한 후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 두발자율화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자신의 주장으로 제게 열변을 토한 친구가 있었기에 툭 던지는 그 친구의 말에 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녀석은 의외라는 듯 “오! 도전장!” 이란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교단에 섰지만 마음 수양이 덜되었는지, ‘이놈들이 어리지만,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나.’ 싶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섭섭해졌습니다. 선생도 역시 사람인가 봅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의 반응을 뒤로한 채 천천히 시 한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쳐다만 봅니다. / 거칠고 투박한 손이 들어옵니다.
쳐다만 봅니다. / 사소한 잔소리가 싫기만 합니다.
쳐다만 봅니다. / 매몰찬 체벌에 화가 납니다.
시간이란 안경을 쓰고 들여다 봅니다.
애정 어린 고운 손이 들어옵니다.
들여다 봅니다. / 걱정 어린 충고가 싫지 않습니다.
들여다 봅니다. / 우릴 위한 마음이란 걸 알기에 부끄러워집니다.
다시 한 번 바라보니 / 당신은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조용히 낭송을 마친 그 아이는 이어서 다음 글을 읽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학교에 봉사하고 학생들을 아들처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 후부터 늘 저희들에게 잘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희생해 주셨는데 일찍 깨닫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어떤 선생님보다 열정적인 선생님, 그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그 아이의 말마디가 제 가슴팍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생명체가 된 것처럼 제 가슴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연이어 화사한 꽃들로 피어납니다. 어느새 제 마음 속은 천국의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위해 바치는 시라는 아이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참으려 했지만 제 시야는 또다시 뿌옇게 변해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박수소리와 환호가 귓전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 수고로움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열일곱의 순수함에 전 그만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는 말밖에.
저는 올해도 또 담임을 맡을 것입니다. “담임은 교사의 꽃”입니다. 세상이 많은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묻고 아이들의 철없음에 심한 내적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서 “내 새끼”가 있는 ‘담임’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았던, 늘 함께 했던 열두 제자 중 1/4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세 번이나 모른다 하고, 한 사람은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 의심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은전 몇 푼에 스승인 예수를 적의 손에 넘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발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정성껏 씻기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요.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우리 예수님처럼 살을 도려내고 피를 바칠 정도의 고통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더더욱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 되어 살려고 합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실 예수님 앞에서 조금은 덜 부끄러운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저 새벽의 여명 속에 돋아 오르는 태양도, 제 말이 맞다며 더 환한 빛을 저에게 보냅니다.

* 이유정 선생님은 계산주교좌성당 신자로,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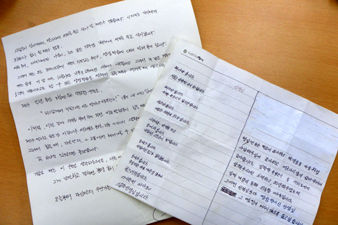 지난 2013년은 제게 참 축복 같은 해였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맡아 본 고1 아이들은 제게 신선함과 설렘을 선물했습니다. 중학생 티를 제대로 벗지 못한 순수함이 저를 참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연일 많은 대중매체들이 ‘학교폭력’이란 단어를 쏟아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교실 청소 당번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1부 야간 자율학습 후 쉬는 시간 20분간 청소를 위해 교실을 향해오는 우리 반 아들들이 있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자발적으로 친구들의 몸수색까지 감행하며 학급 전체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주는 멋진 아들, 피곤해 보인다며 집에서 쉬라는 다정한 말을 건네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아들들이 있었던 2013년은 제겐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 감사”를 외치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13년은 제게 참 축복 같은 해였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맡아 본 고1 아이들은 제게 신선함과 설렘을 선물했습니다. 중학생 티를 제대로 벗지 못한 순수함이 저를 참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연일 많은 대중매체들이 ‘학교폭력’이란 단어를 쏟아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교실 청소 당번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1부 야간 자율학습 후 쉬는 시간 20분간 청소를 위해 교실을 향해오는 우리 반 아들들이 있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자발적으로 친구들의 몸수색까지 감행하며 학급 전체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주는 멋진 아들, 피곤해 보인다며 집에서 쉬라는 다정한 말을 건네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아들들이 있었던 2013년은 제겐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 감사”를 외치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12월의 그날도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교단에 섰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그 아이는 무척이나 쑥스러워하며 교탁에 몸을 구부린 채 한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시 한편을 낭송한 후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 두발자율화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자신의 주장으로 제게 열변을 토한 친구가 있었기에 툭 던지는 그 친구의 말에 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녀석은 의외라는 듯 “오! 도전장!” 이란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교단에 섰지만 마음 수양이 덜되었는지, ‘이놈들이 어리지만,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나.’ 싶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섭섭해졌습니다. 선생도 역시 사람인가 봅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의 반응을 뒤로한 채 천천히 시 한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그날도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교단에 섰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그 아이는 무척이나 쑥스러워하며 교탁에 몸을 구부린 채 한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시 한편을 낭송한 후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 두발자율화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자신의 주장으로 제게 열변을 토한 친구가 있었기에 툭 던지는 그 친구의 말에 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녀석은 의외라는 듯 “오! 도전장!” 이란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교단에 섰지만 마음 수양이 덜되었는지, ‘이놈들이 어리지만,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나.’ 싶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섭섭해졌습니다. 선생도 역시 사람인가 봅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의 반응을 뒤로한 채 천천히 시 한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