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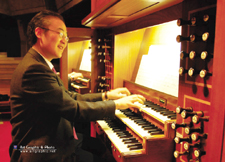
1763년의 여름, 모차르트가 일곱 살 때의 일이다. 아버지 레오폴드는 모차르트와 큰 딸 난네르를 데리고 유럽 전역에서 음악에 관심 있는 왕과 귀족들, 저명인사들을 만나 ‘신이 내린 재능’을 선보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삼 년에 걸친 이 연주 여행은 독일 남부 지역, 벨기에,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을 거쳐 다시 오스트리아로 되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요즈음처럼 비행기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온갖 짐을 실은 채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기껏해야 싸구려 여인숙에 기거하는 일상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 와중에 모차르트는 파리에서 5개월간 머물면서 바이얼린소나타 네 곡을 출판하였고, 런던에서는1년 반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바흐의 막내아들인 크리스티안 바흐와 같이 유명한 음악 선생을 만나 레슨을 받으며 교향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왕궁이나 귀족들 저택에서의 만찬에 초대되어 높은 분들을 만나 이름을 알리고 화려한 연주를 그 자리에서 펼쳐 보임으로써 두둑한 사례비를 거둬들이기도 했으니, 요즈음 말로 자녀들의 교육과 스펙 쌓기, 그리고 돈벌이에 이르는 일석삼조의 효과의 노린 유랑생활이었던 셈이다. 훗날 아버지 레오폴드는 어느 편지에서 이 시기의 모차르트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넌 어렸을 적에 애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웠다. 피아노 앞에 앉아 음악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감히 농담 한 마디 건넬 수 없었으니 말이다. 네가 연주할 때는 너무나 진지했고, 그렇게 찬연하게 꽃피운 네 재능과 네 조그마한 얼굴을 지켜보면서, 외국의 많은 이들이 이 아이가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곤 했었다.”
당시 모차르트 집안의 텃밭이었던 아우크스부르의 한 신문에서도 한 익명의 기고자는 이 가족의 연주여행을 소개하면서 볼프강이라 불리는 신동의 놀라운 재능의 일면을 묘사하는 글을 실었다. “더 나아가 내가 듣고 본 바를 적자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다른 옆방에 둔 채로 피아노를 소리 내어 그 음이 어떤 음인지 알아맞추게 했다. 높은 음과 낮은 음들을 번갈아 쳐주자 그 아이는 이 음들의 계이름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대었다. 피아노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종소리나 회중시계소리, 심지어는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시계의 초침소리조차 듣는 그 즉시 계이름으로 대답할 능력을 이 아이는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모차르트가 “절대음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거로 종종 인용되곤 하는 이 글을 보면서, 음악가인 필자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오늘 날 거의 모든 피아노는 똑같은 음높이(a=440Hz)로 조율되어 있기에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쳐온 사람들의 경우 계이름에 따른 음정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모차르트 시대만 하더라도 나라나 도시마다 악기 조율의 기준 음높이가 저마다 달라서 음이 반음 내지 한 음 정도 높고 낮았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시 말해 절대적인 음높이라는 기준이 없던 시기에 절대음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최근 통계에 따르자면 대략 1만 명당 1명꼴로 이런 절대음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 같은 절대 음감이 천재적 음악가의 조건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만 4000명 이상 가는 대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모차르트가 “절대음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거로 종종 인용되곤 하는 이 글을 보면서, 음악가인 필자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오늘 날 거의 모든 피아노는 똑같은 음높이(a=440Hz)로 조율되어 있기에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쳐온 사람들의 경우 계이름에 따른 음정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모차르트 시대만 하더라도 나라나 도시마다 악기 조율의 기준 음높이가 저마다 달라서 음이 반음 내지 한 음 정도 높고 낮았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시 말해 절대적인 음높이라는 기준이 없던 시기에 절대음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최근 통계에 따르자면 대략 1만 명당 1명꼴로 이런 절대음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 같은 절대 음감이 천재적 음악가의 조건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만 4000명 이상 가는 대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감히 결론을 내리자면 절대음감이 곧 음악의 신동으로 이어지는 조건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음악적으로 반복된 훈련의 산물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뜬구름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설령 내 아이가 이런 재능을 보이더라도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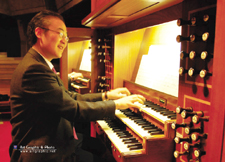
 우리가 흔히 말하듯 모차르트가 “절대음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거로 종종 인용되곤 하는 이 글을 보면서, 음악가인 필자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오늘 날 거의 모든 피아노는 똑같은 음높이(a=440Hz)로 조율되어 있기에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쳐온 사람들의 경우 계이름에 따른 음정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모차르트 시대만 하더라도 나라나 도시마다 악기 조율의 기준 음높이가 저마다 달라서 음이 반음 내지 한 음 정도 높고 낮았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시 말해 절대적인 음높이라는 기준이 없던 시기에 절대음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최근 통계에 따르자면 대략 1만 명당 1명꼴로 이런 절대음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 같은 절대 음감이 천재적 음악가의 조건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만 4000명 이상 가는 대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모차르트가 “절대음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거로 종종 인용되곤 하는 이 글을 보면서, 음악가인 필자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오늘 날 거의 모든 피아노는 똑같은 음높이(a=440Hz)로 조율되어 있기에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쳐온 사람들의 경우 계이름에 따른 음정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모차르트 시대만 하더라도 나라나 도시마다 악기 조율의 기준 음높이가 저마다 달라서 음이 반음 내지 한 음 정도 높고 낮았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시 말해 절대적인 음높이라는 기준이 없던 시기에 절대음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최근 통계에 따르자면 대략 1만 명당 1명꼴로 이런 절대음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 같은 절대 음감이 천재적 음악가의 조건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만 4000명 이상 가는 대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