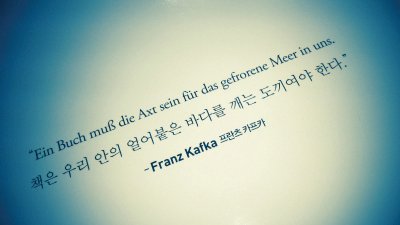|
요즘 서점에 가보면 유독 눈에 띄는 책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기(武器)가 되는가’ 운운하는 책들입니다. 몇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역사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무기가 되는 심리학’, ‘삶의 무기가 되는 독서’, ‘삶의 무기가 되는 글쓰기’, ‘삶의 무기가 되는 한마디’,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 ‘무기가 되는 스토리’ 등속으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것들도 무기라 부릅니다. ‘침묵이라는 무기’, ‘고독이라는 무기’, ‘감정이라는 무기’ 운운, 예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책 표지에 노골적으로 칼 그림까지 그렸더군요. 칼 그림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게 됩니다. 몸을 옹송거리게 됩니다. ‘어서 지식들로 무장을 하라’고 ‘무기가 없으면 험난한 세상에서 남에게 당하고 만다’고 책들이 소리칩니다. 서점 진열대에서 줄을 맞춰 열병식을 합니다. 책들이 무장을 하고 진군을 합니다. 순간 아득해집니다. 인간이 고되게 읽고 쓰는 목적이 정말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인지요? 무기를 갖춰서 남을 찌르기 위해, 정말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읽고 쓰는지요. 이 세상이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그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찌르지 않으면 내가 찔리는 세상인지요?
‘무기’라는 제목으로 근래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일본 작가 야마구치 슈가 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2019)라는 책입니다. 각 철학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이 되는지, 철학이 어떤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쓴 책입니다. “철학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는 책표지의 문구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철학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는 말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 철학이다’로 읽힙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며, 철학이 진정한 철학이 되려면 모든 문제에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요컨대 철학은 혼란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 그런 일도양단(一刀兩斷)의 기백이 이 책에는 서려 있습니다. 무기가 되는 책들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무기를 들고 망설여선 안 되듯이, 무기를 자처하는 책들에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선과 악도 양단으로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知性)은 복잡한 현상들에서 명확한 답을 구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견디게 하는 힘일까요? 인간의 지성이 고귀하다면, 그것은 지성이 우리에게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망설임 없는 단호함이 지성의 특성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 앞에서 조심스레 머뭇거리고 망설일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인간다운 지성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답을 내려는 유혹만 잘 견뎌도, 우리는 좀 더 유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글을 읽고 쓰며, 생각을 다듬는 이유는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답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겠지요. 요컨대 나의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서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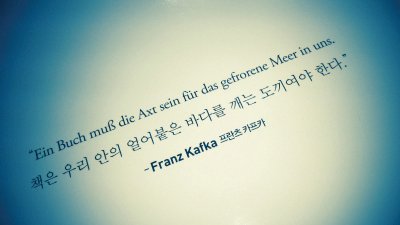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는 말합니다.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Ein Buch muß die Axt sein fur das gefrorene Meer in uns)” 카프카가 책을 섬뜩한 도끼로 비유할 때, 그 도끼는 남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얼어붙은 바다’처럼 굳은 내 생각을 깨기 위해서 ‘도끼’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책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책이 무기로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의 굳은 생각을 깨는 도구일 때만 그러할 것입니다. 책이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제압하는 도구로만 쓰인다면 책은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되겠지요.
‘무기’라는 제목을 단 책들의 열병식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책들은 고작 무기(武器)가 되어야 하는지요.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이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되면 어떻습니까. 밥을 담아 건네는 ‘식기(食器)’가 되는 것은 어떠하며 고운 선율을 전하는 악기(樂器)가 되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 무엇이 되던 무기(武器)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어떤 지식도 무기로 불리지 않고, 좀 더 아름답고 부드러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세상, 말랑말랑한 생각들이 딱히 목적 없이 부유해도 좋은 세상, 그 세상을 꿈꾸며 건네는 인사입니다. 이제 부디 ‘무기여 잘 있거라.’
|